-
단편짬뽕: 2025 현진건문학상 강정아

 HOME
HOME윤에 대하여: 2025 수상작가 자선작
2025 현진건문학상 수상작가 자선작
「윤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노와 혐오에 관한 이야기다. 전쟁과 학살 같은 인류의 비극적 대서사도 개인의 생활무대에서 벌어지는 이기적 존재들 간의 마찰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으려 했다. 정치와 역사를 타자화함으로써 개인들은 성찰의 기회를 곧잘 잊는다.
직장 후배인 윤은 퇴근길에 대로에서 무참하게 살해된다. 사건은 다양한 파장을 불러온다. 나는 사무실을 나와 무능한 상사, 이전투구하는 동료들, 무리를 짓고 서로를 혐오하는 부박한 사회, 전쟁과 학살로 얼룩진 역사를 냉소하며 윤과 함께했던 일상의 장소들을 순례한다. 나 자신 또한 냉소의 대상이다.
직장 후배인 윤은 퇴근길에 대로에서 무참하게 살해된다. 사건은 다양한 파장을 불러온다. 나는 사무실을 나와 무능한 상사, 이전투구하는 동료들, 무리를 짓고 서로를 혐오하는 부박한 사회, 전쟁과 학살로 얼룩진 역사를 냉소하며 윤과 함께했던 일상의 장소들을 순례한다. 나 자신 또한 냉소의 대상이다.
갈 데를 정해놓고 나온 것이 아니라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연구소를 벗어나면 담배 피울 곳이 마땅하지 않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흡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뿜어낸 담배 연기가 실없이 흩어지는 걸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그 새끼를 생각했다. 개새끼. 씨발놈.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릴 거야. 사람에게 한 번도 내뱉어 본 적 없는 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칼로 한 삼십 번 정도 찔러서 갈기갈기 그 새끼 몸을 찢어놓고 싶다.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올 때까지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나의 루틴이었다. 윤이 주머니에 주전부리들을 넣어서 직원들에게 돌렸던 그날 밤, 잘 준비를 하고 침대 머리에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그 영상을 보았다. 그 새끼가 어떤 여자를 천천히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CCTV 영상은 그 새끼가 여자에게 최초의 일격을 가하기 직전에서 멈췄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도 보였다. 영상은 멀기도 했고 해상도가 낮았지만 실제 상황이라니 끔찍했다.
웬 미친놈이 별 이유도 없이 모르는 여자를 공격해 죽인 사건은 듣도 보도 못했을 정도로 희귀한 사건은 아니었다. 이례적인 건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공간이 사람의 왕래가 활발한 퇴근 시간 직후의 도심 한가운데였다는 점이었다. 그 새끼는 모르는 여자를 여러 차례 찌르고 나서 마지막에는 귀찮다는 듯 칼을 여자의 몸에 그대로 꽂아둔 채 주변을 설렁설렁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었다. 사람이 모인 장소에는 미친 놈도 꼭 한두 명 섞여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매일 그토록 위험한 거리를 기적적으로 통과해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간다, 영상 속 그 여자만 빼고. 무섭고 불쾌해서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껐다. 그러니까 그날 밤 나는 핸드폰으로 그 거리의 어느 CCTV에 찍힌 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고, 그다음 날 그게 바로 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올 때까지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나의 루틴이었다. 윤이 주머니에 주전부리들을 넣어서 직원들에게 돌렸던 그날 밤, 잘 준비를 하고 침대 머리에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그 영상을 보았다. 그 새끼가 어떤 여자를 천천히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CCTV 영상은 그 새끼가 여자에게 최초의 일격을 가하기 직전에서 멈췄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도 보였다. 영상은 멀기도 했고 해상도가 낮았지만 실제 상황이라니 끔찍했다.
웬 미친놈이 별 이유도 없이 모르는 여자를 공격해 죽인 사건은 듣도 보도 못했을 정도로 희귀한 사건은 아니었다. 이례적인 건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공간이 사람의 왕래가 활발한 퇴근 시간 직후의 도심 한가운데였다는 점이었다. 그 새끼는 모르는 여자를 여러 차례 찌르고 나서 마지막에는 귀찮다는 듯 칼을 여자의 몸에 그대로 꽂아둔 채 주변을 설렁설렁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었다. 사람이 모인 장소에는 미친 놈도 꼭 한두 명 섞여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매일 그토록 위험한 거리를 기적적으로 통과해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간다, 영상 속 그 여자만 빼고. 무섭고 불쾌해서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껐다. 그러니까 그날 밤 나는 핸드폰으로 그 거리의 어느 CCTV에 찍힌 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고, 그다음 날 그게 바로 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4년 장편소설 『책방, 나라사랑 』 출간
2025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
2025 현진건문학상 수상
jakang71@naver.com
윤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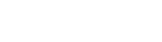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