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빈 상자: 2025 추천작 김인정

 HOME
HOME빈 상자: 2025 추천작
2025 현진건문학상 추천작
깜깜한 새벽, 아파트에 떠 있던 하나의 불빛을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됐다.
빛은 불안하지만 친근하고 따뜻해 보였다. 다른 누군가도 나처럼 어둠 속에 숨어서 위로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빛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울림은 한동안 계속됐고, 예측할 수 없는 이들과의 공감도 이어졌다.
그러니 소설 속 수영에게도 창피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새벽 네 시 수영이 몰두했던 빛은 우리 중 누군가의 빛이었을 수도 있다. 창 너머 어둠을 헤아려야 했을 누군가의 염원이 타오른 것일 수도. 우리는 서로의 빛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지만,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지만, 그만큼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소설의 두 번째 결말은 이렇다. 수영의 짐이 채워진 빈 상자는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듯 문밖에 서서 택배 기사를 기다린다. 아파트는 멀어지고 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총총히 빠져나온다.
빛은 불안하지만 친근하고 따뜻해 보였다. 다른 누군가도 나처럼 어둠 속에 숨어서 위로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빛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울림은 한동안 계속됐고, 예측할 수 없는 이들과의 공감도 이어졌다.
그러니 소설 속 수영에게도 창피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새벽 네 시 수영이 몰두했던 빛은 우리 중 누군가의 빛이었을 수도 있다. 창 너머 어둠을 헤아려야 했을 누군가의 염원이 타오른 것일 수도. 우리는 서로의 빛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지만,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지만, 그만큼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소설의 두 번째 결말은 이렇다. 수영의 짐이 채워진 빈 상자는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듯 문밖에 서서 택배 기사를 기다린다. 아파트는 멀어지고 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총총히 빠져나온다.
불빛이었다. 밝아진 주변 탓에 생기를 잃긴 했지만 빛이 확실했다. 25층과 26층 사이였다. 그녀가 창가로 다가가는 동안 불은 꺼졌다. 폰의 화면을 확인하는 사이 불은 다시 들어왔다. 다섯 시 반이었다. 빛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그것은 창문 밖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조금씩 솟아올랐다. 마치 벽이라도 타고 오르듯. 마침내 유리창 빛이 거의 가려질 정도로 형상이 드러났을 때야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지 알 듯했다.
수영은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막고 주저앉았다. 몸을 웅크린 채 생각했다. 떨리는 손으로 폰을 바로 잡았다. 폰의 잠금 패턴을 풀고 숫자를 누르려던 그녀는 멈칫했다. 잘못 봤을 수도 있었다.
창밖을 다시 내다보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수영은 몸을 끌어 올렸다. 창 가장자리에 붙어 서서 고개만 살짝 밖으로 내밀었다.
그새 불 켜진 창들이 늘었을 뿐 아파트는 무심한 모양새였다. 계단참 창에는 불빛도 그림자도 없었다. 그녀는 눈을 비볐다. 헛것을 봤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주저앉았던 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까.
수영은 서둘렀다. 방충망을 열고 난간 위로 허리를 깊숙이 굽혔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쏟아지며 시선을 가렸다. 갑자기 쏠린 상반신의 무게로 하체가 풍선처럼 붕 떠오르려 했다. 그녀는 가까스로 난간 기둥에 팔을 감았다. 풍선 실처럼 팔은 난간에 매듭을 꼭 지었다. 이대로 떨어졌다면 목이 부러졌을까. 몸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난간대에 매가리 없이 늘어졌다. 그녀는 107동 발목을 덮고 있는 나무들의 정수리를 더듬었다. 개 한 마리를 앞세운 누군가가 그 아래를 벗어나고 있을 뿐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수영은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막고 주저앉았다. 몸을 웅크린 채 생각했다. 떨리는 손으로 폰을 바로 잡았다. 폰의 잠금 패턴을 풀고 숫자를 누르려던 그녀는 멈칫했다. 잘못 봤을 수도 있었다.
창밖을 다시 내다보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수영은 몸을 끌어 올렸다. 창 가장자리에 붙어 서서 고개만 살짝 밖으로 내밀었다.
그새 불 켜진 창들이 늘었을 뿐 아파트는 무심한 모양새였다. 계단참 창에는 불빛도 그림자도 없었다. 그녀는 눈을 비볐다. 헛것을 봤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주저앉았던 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까.
수영은 서둘렀다. 방충망을 열고 난간 위로 허리를 깊숙이 굽혔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쏟아지며 시선을 가렸다. 갑자기 쏠린 상반신의 무게로 하체가 풍선처럼 붕 떠오르려 했다. 그녀는 가까스로 난간 기둥에 팔을 감았다. 풍선 실처럼 팔은 난간에 매듭을 꼭 지었다. 이대로 떨어졌다면 목이 부러졌을까. 몸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난간대에 매가리 없이 늘어졌다. 그녀는 107동 발목을 덮고 있는 나무들의 정수리를 더듬었다. 개 한 마리를 앞세운 누군가가 그 아래를 벗어나고 있을 뿐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빈 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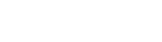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