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열꽃이 피는 이유 최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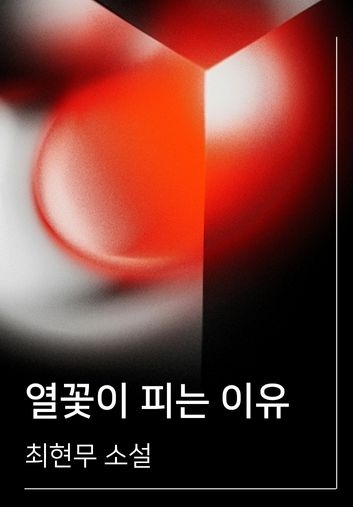
 HOME
HOME필리핀에서 부활절 주간에 열리는 ‘쿠투드 렌텐 의식’은 예수가 걸었던 고난의 길을 따라 걸으며 참회하는 축제입니다. 한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욕했습니다. 미개하다고. 그리고 며칠 뒤 피부에 발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려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 할 정도로,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로.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게 단지 피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한 발만 벗어나도 사람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밥도, 위생도, 언어도, 체면도, 심지어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감정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사이, 내 안에 숨어 있던 얼굴 하나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끄럽고, 찌질하고, 좀 우습고, 그래도 조금은 솔직한.
그 얼굴을 마주한 뒤부터 가려움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 소설은 살면서 한 번쯤 누구나 겪게 되는 자기만의 열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가려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 할 정도로,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로.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게 단지 피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한 발만 벗어나도 사람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밥도, 위생도, 언어도, 체면도, 심지어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감정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사이, 내 안에 숨어 있던 얼굴 하나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끄럽고, 찌질하고, 좀 우습고, 그래도 조금은 솔직한.
그 얼굴을 마주한 뒤부터 가려움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 소설은 살면서 한 번쯤 누구나 겪게 되는 자기만의 열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축제에서 돌아온 날 악몽을 꾸었다. 일어났을 때는 손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얼얼했고 몸은 땀으로 축축했다.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여기저기 만지며 확인했다. 그러고도 한동안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몸에 이상이 온 건 며칠이 지나서였다. 처음에는 붉은 반점 한두 개가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밤이 되자 눈에 띄게 반점이 늘었다. 드디어 물갈이인가 했지만, 물갈이의 특징인 설사는 없었다. 아침이 됐을 때 상처처럼 반점이 긁혀있었다. 기분이 찝찝했지만, 저절로 수그러들길 바라며 기다리기로 했다. 수업 시간에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긁었다. 그날 저녁 샤워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했지만, 학원의 더러운 상수도를 본 적이 있어 개운하지 않았다.
어학원은 대부분 한국인과 몇 명의 일본인과 대만인으로 채워졌다. 나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나보다 많은 사람은 일본에서 온 할아버지와 한국인 중년 부부 정도였다. 돈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맛은 형편없었다. 여자애들은 주로 장을 봐 직접 해 먹었지만 시간 뺏기는 게 싫은 나는 식당을 이용했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주방은 어설픈 한식이 주를 이루었다. 남자애들은 거의 식당에서 먹었다. 성인이 되어 낯선 사람들과 같이 먹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일본인들은 불평 없이 잘 먹었다. 이제 이십 대 초반 남자애들이 짓궂은 표정으로 물었다.
“누나, 이 건물 물탱크 봤어요? 주방 창문으로 보면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신기한 거라도 발견한 양 키득대며 말했다. 열악한 주방으로 난 창문으로 다가가 고개를 내밀었다. 건물 오 층 옥상에 있는 물탱크는 시멘트로 지어졌는데 뚜껑이 없었다. 물탱크 청소를 한 적 없는지 고층에서 내려다본 물은 그야말로 똥물이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았고 온갖 오물들이 둥둥 떠 있었다. 인상을 쓰자 남자애들이 쿡쿡댔다.
“저 물로 요리하는 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온 건 며칠이 지나서였다. 처음에는 붉은 반점 한두 개가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밤이 되자 눈에 띄게 반점이 늘었다. 드디어 물갈이인가 했지만, 물갈이의 특징인 설사는 없었다. 아침이 됐을 때 상처처럼 반점이 긁혀있었다. 기분이 찝찝했지만, 저절로 수그러들길 바라며 기다리기로 했다. 수업 시간에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긁었다. 그날 저녁 샤워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했지만, 학원의 더러운 상수도를 본 적이 있어 개운하지 않았다.
어학원은 대부분 한국인과 몇 명의 일본인과 대만인으로 채워졌다. 나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나보다 많은 사람은 일본에서 온 할아버지와 한국인 중년 부부 정도였다. 돈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맛은 형편없었다. 여자애들은 주로 장을 봐 직접 해 먹었지만 시간 뺏기는 게 싫은 나는 식당을 이용했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주방은 어설픈 한식이 주를 이루었다. 남자애들은 거의 식당에서 먹었다. 성인이 되어 낯선 사람들과 같이 먹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일본인들은 불평 없이 잘 먹었다. 이제 이십 대 초반 남자애들이 짓궂은 표정으로 물었다.
“누나, 이 건물 물탱크 봤어요? 주방 창문으로 보면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신기한 거라도 발견한 양 키득대며 말했다. 열악한 주방으로 난 창문으로 다가가 고개를 내밀었다. 건물 오 층 옥상에 있는 물탱크는 시멘트로 지어졌는데 뚜껑이 없었다. 물탱크 청소를 한 적 없는지 고층에서 내려다본 물은 그야말로 똥물이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았고 온갖 오물들이 둥둥 떠 있었다. 인상을 쓰자 남자애들이 쿡쿡댔다.
“저 물로 요리하는 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2025년 5.18문학상 신인상 당선
웹북 『점심은 없습니다』, 『열꽃이 피는 이유』 출간
열꽃이 피는 이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5 | 타인의 고난이 전이된 나의 고난 | 바이올렛 | 2025-09-22 |
| 4 | 몰입감이 짱이에요. | 보라레오 | 2025-09-17 |
| 3 | “낯섦이 불편한 성찰로 이어지는 깊고 강렬한 독서 경험.” | ciel | 2025-09-07 |
| 2 | 열꽃과 가려움이 독자에게도 스멀대게 하는 글. | aunthoho | 2025-09-07 |
| 1 | 필리핀 맛집이네요. | 대롱이 | 2025-09-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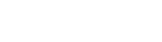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