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작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것은 의존명사죠. 자립형태소이지만, 자립성이 없어 홀로 쓰일 수는 없죠. 그러나 단어로 취급하긴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 사람인데, 혼자 서거나 존재하진 못하는. 그런 게 것이에요."
소설의 도입부에서 꽂힌 문장이었다. 국어국문학 전공병-관련 지식이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증상이다-이 도지는 바람에 이 의미심장한 문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작가는 '이해'의 영역에 대한 소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입부가 가진 의미가 소설 속에서 어떤 이해관계로 드러나 있을지 호기심이 생겼다.
자고로 이해관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물들의 관계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소설 속 인물들의 관계는 심상치 않다.
주인공 '나'와 '@Gooooood'('것'이라고 불러달라 했으니 이하 것으로 통칭)의 관계는 미묘하다.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지만, 어떤 계기로 '나'는 '것'과 멀어졌다.
'나'를 방관자로서 학교폭력의 가해자 범주에 들여야 좋을지 아닐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를 것이다. 어쨌든, 네일샵에서 '나'와 '것'은 다시 만났지만, 서로 존대를 해야 할 만큼 사이는 멀어졌다.
'것'은 서로 존대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것'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해 그녀의 닉네임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간극을 훌쩍 생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가 어색하든 말든, '것'의 말처럼 서로에게 이로운 것이겠지.
이 관계성을 생각하며 '나'가 처한 상황을 본다면 참 아이러니 할 것이다. '나'의 아들 '현욱'은 죽었다. '현욱'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 그것도 피해자를 때리고, 돈을 빼앗을 정도로 적극적인. 결국 피해자 학생이 칼로 찔러 죽였다. 거기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뒤집혀버렸다. 하지만 아들이 죽었음에도 '나'는 피해자로 입장 전환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학교폭력 피해자이기도 한) 부모로부터 폭언과 저주를 듣게 된다. 무릎 꿇고 선처해달라고 빌 거라고 생각했던 예상은 빗나갔다. '현욱'을 죽인 애를 봤을 때에도 현욱의 잘못을 떠올리기보단 '이렇게 소심하고 한심한 애가 우리 애를...'이라고 생각한다. 그 애의 이름을 들었음에도 기억하지 못한다.
'나'와 '것'이 마주하며 학창 시절 멀어졌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것'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느냐는 '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왜 떠날까 원망했지만 깨달았다고. 의지('나'의 이름) 씨의 것이었음을. 자립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의 쓰임을 다해 스스로 멀어진 것이므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또다시 '뭐뭐의 것'의 뭐뭐를 찾아다녔다고. '나'는 '것'에게, 자신의 아들이 칼에 찔려 죽을 만큼 잘못한 거냐고 묻는다. 이 지점에서 둘의 관계성 역시 역전되는 듯하다. '나'는 무슨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걸까? '것'은 대답한다. '의지 씨 아들은,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라고. '나'는 '것'에게 용서받고 싶었을까?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 대답이 듣고 싶었을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 현욱의 잘못 역시 원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을까? '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의존명사이자 자립형태소가 되는 장면 같았다.혼자 서거나 존재하지 못하고 타인의 이해에 의존해야 하는.
이 소설에서 눈에 띄는 다른 장치는 '내성발톱'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내성발톱'은 '죄책감'을 상징하는 장치처럼 느껴졌다. 끝이 안쪽으로 휘어 들어 살갗을 파고들어 계속 아프게 하는 것. '나'는 소설 초반부부터 '것'에게 내성 발톱을 교정 관리 받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욕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순간 잘 관리 받던 발톱이 통째로 빠져버린다. 발톱은 새로 자라니까 기다리는 편이 좋다는 조언을 보지만, '나'의 전화에 '것'은 발톱을 들고 자신에게로 오라고 말한다. '것'을 향해 가던 '나'는 그제야 '것'의 이름을 생각해낸다. '대상'에서 '존재'로 둘의 관계성이 전환되는 지점을 본 것 같았다.
작가의 의도와 장면의 의미를 거듭 생각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었던 작품이었다. 읽고 나서의 여운이 깊은 작품을 보여준 작가의 다음 작품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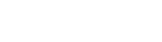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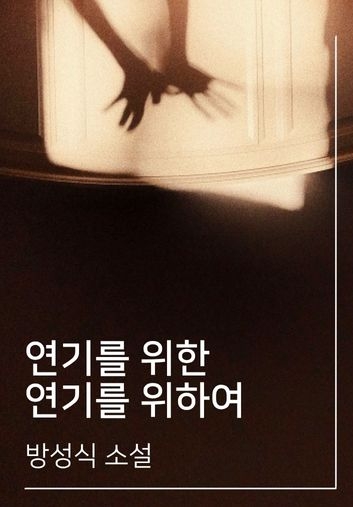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