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제목을 보자마자, 내가 이 소설을 좋아하겠거니 싶은 소설이 가끔 있다. 취향이란 편협한 요소에서 발단된 것이기는 한데, 어떤 본능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눈길이 가는 제목, 이런 이름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레는 작품. 작가가 이 아름다운 언어의 나열을 멋지게 형상화했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 구효서 소설가의 <그녀의 야윈 뺨>이다.
소설은 서른여덟 살 어느 연극배우가 18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한 어느 밤을 중심에 두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예술가로서 서른여덟이 된 주인공과 미국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는 여자. 둘은 대학 시절 미팅에서 만났고,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잠자리는 가지지 않았다. 뻔한 표현이기는 하나, 둘은 서로에게 순수한 사랑, 청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남녀 주인공이 환상과도 같은 대학로의 밤으로 입장한다. 돌아가며 노래하고. 서로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 공연이 있고, 관객이 있고, 춤추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의 정경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두 주인공의 현실은 화려한 대학로와 내내 대비된다. 남자는 이제 현실보다도 연극으로 산 기간이 훨씬 길다. 그에게는 정체성의 상실이 덤덤하다. 현실이 아닌 연극 자체가 토대가 되어 가는 연극판 속, 이제는 차라리 현실이 혼동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그 옆에 여자는 결혼 후 야윈 뺨만이 선명하다.
현재 시점 대학로의 보여주기는 두 사람 앞에 청춘을 애달프게나마 되살려 보려는 작가의 시도로 읽혔다. 지독한 현재와 낭만적인 과거가 대조되며, 애달픔이 차오른다. 그럼에도 옆자리 테이블 넥타이 부대와 다툼하는 철없는 주인공,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웃는 남녀에 피식 씁쓸한 미소가 지어진다. 서른여덟이 되어 하는 인생 3번째 싸움, 떼거리로 맞으면서도 ‘오늘은 참 이상한 날이로구나,’ 하고만 생각하는 주인공의 소년성이 되레 아프게 읽힌다. 이런 대비가 효과적으로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그게 독자인 내게 그대로 전이되었다.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데도, 서글픈 감정이 점점 쌓인다. 그 원인은 주인공의 현실뿐만 아니라 뭔가 미심쩍은 첫사랑의 야윈 뺨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다는 그녀는 내내 뭔가 미심쩍다. 토로하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대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부자연하다.
두 사람의 밤 이후, 남자 여자의 현실을 수소문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그녀의 야윈 빰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어떤 마비의 흔적의 의의가 선명해지는 순간, 사무치는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현실을 목도하고는 본인의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남자의 뒷모습이 애석하다. 그러나 비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비난할 수 없는 독자인 나마저, 애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야윈 청춘을 이리도 서정적으로 그려낸 작품이 반가웠다. 내 편견이 오랜만에 제대로 작동한 것 같아 기쁘다. 리뷰를 마치며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야윈 뺨밖에 생각나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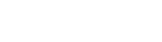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