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한때 SNS에서 유행했던 질문 챌린지(?)가 있었다.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거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듣는 것이었다.
유행이 한창 돌 때는 흥미가 없었는데, <마망>을 읽고 궁금해져서 재미삼아 엄마한테도 질문했다.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아빠의 대답은 뻔하게 예상이 됐다. '그런 걸 왜 물어보노?' 그래서 안 물어봤다. 근데 이상하게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 지 예상이 안 됐다.
엄마는 별 고민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모습이 변했을 뿐, 결국엔 내 딸이니까 안 죽게 잘 키울 거야'
이시경 작가의 <마망> 도입부를 읽으면서 SNS에 유행했던 바퀴벌레 질문이 바로 떠올렸다. 이 소설에서는 바퀴벌레 대신 거미로 변하지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 생각나기도 했다.
당연하고 마땅했던 존재가 갑자기 낯설게 변한다면? 이 질문은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제법 클리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가 낯선 존재로 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 질문에는 두 가지의 함의가 숨어 있다고 느낀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메세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으면 하는 소망'
<마망>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소설은 그 함의들을 가장 선명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대상인 '엄마'가 거미로 변하면서 시작한다.
(왜 하필 거미일까? 라는 질문에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이라는 거대한 거미 조형물을 한 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소설 내용은 스포일러 같아서 자세히 밝히지 못하지만, 거미가 된 엄마 자영의 처지는 꽤나 비참하다.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사실 존재의 역할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배신감,
역할을 담당할 존재가 사라지자 바로 대체자를 들이라는 남편의 '마망'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오는 분노,
소설에 묘사되는 모든 상황이 지극히 현실을 모방하고 있다는 생각에 드는 무력감 등.
그리고 어느덧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도달해있는 독자들에게 물음표를 선사하는 결말까지.
개인적으로 이 소설은 출발점인 질문(당연하고 마땅했던 존재가 낯설게 변한다면?)이 가진 함의 두 가지를 철저하게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학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주인공 자영의 가족들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존재를 잃었고(잃다 못해 대체해버리기까지 했다), 거미가 된 자영까지는 사랑하지 못했다. (거미가 된 자영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했다)
대신, 자영은 자유와 고유함을 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자영이 자판 위를 열심히 오가며 쓴 소설이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까.
한편으로는, 이시경 작가의 다른 스타일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잘 짜여진 기존의 소설들에 비해 <마망>은 뭔가 비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공백을 독자 스스로 사유하며 채워본다면 더 풍부하게 읽힐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질문에 대한 엄마의 대답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질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엄마의 대답을 섣불리 예측하지 못했다. 소설 <마망>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들려주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며 독서를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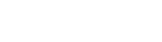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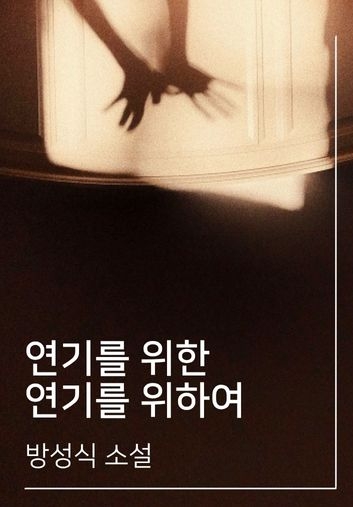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