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살아야 할 근사한 이유라도>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집요한 작가의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죽은 건가 산 건가 싶은 부조리한 삶. 소설 속 모든 인물은 당연한 듯 찾아오는 태풍을 견디는 중이다. 힘듦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채 악몽보다 더 악몽과도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 계절의 끝이자, 시작과도 같은 어느 불행의 굴레에 빠진 상태이다. 실존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
소설은 사시사철 붉은 단풍나무에 가로막힌 창의 풍경으로 시작된다. 남편 진우와 아내 수정, P 세 인물을 중심으로, 장모와 아랫집 여자까지 더해 여러 삶이 죽은 나무의 가지들처럼 엉키는 그림을 그린다. 수정의 암, 장모의 결혼과 이혼, 자살 기도, 아랫집 여자의 스토킹 등. 소설의 현재 이야기는 7년 전 사건을 중심으로 운동하고 있다. 물론 이런 소설이 운동하는 것은 이야기의 힘보다는 삶 그 자체로 보아야 옳다.
이런 소설은 감춰진 서사보다 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는 것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인물의 심적 회로를 따라가는 것에서, 그 깊은 맛이 우러난다. 염세적이든, 낭만적이든, 실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은 부조리하다. 속에 연결된 듯 보이는 인과는 우리 실존의 덧없음을 선명히 할 뿐이다. 해피엔딩도 반복되면 슬픔이 되고, 인간 사이 오해와 불소통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며, 우린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한다. 죽지 않는 이상.
이 소설에서 살아야 할 근사한 이유는 끝내 제시되지 않는다. 사건의 전말은 발설되지 않고 살짝 비치고 끝난다. 그게 되레 이 소설의 희망으로 작동하는 건 흥미로운 아이러니였다. 이유는 어쩌면 제시되지 않아야만 한다. 그게 차라리 우리를 살리기도 하니까.
진우의 작은 의지와 함께 소설은 마무리되고, 질문은 독자에게 넘어간다. 어떤 빛의 가능성 정도의 인상으로. 그러니 터널 속에서 이야기는 끝난 것이다. 허나 작가의식의 돛은 어떤 빛에, 뭔지 모를 희망을 향해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비겁함에도 아이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진우와 바스락대는 소리가 전부 위로인지도 모른다는 문장, 또 앞을 꽉 가로막은 단풍잎에서 시작된 소설이 종국에 아이들의 단풍손에 도달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서, 부조리한 삶에 대해 독자로서 직접 곱씹고 자문하게 되었다.
부조리는 계속될 것이다. 삶은 이미 그 자체로 부조리하니까. 살아야 할 근사한 이유는 아마 없을 것이다. 다만 마지막 진우처럼 ‘살아야 할 이유 같은’ 무언가는 계속 생겨날 것이다. 억지로라도 만들 수 있기도 하다. 독서 후 이런 ‘빛과 같은’ 마음이 내 속에서 피어나는 경험은 값진 것이었다.
끝으로 이 소설은 부조리극의 성격을 띠는 여타 작품들처럼 잡지식을 끌어다 모아 분위기를 잡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이고 싶다. 쓰는 이의 정성과 절제되고 잘 계산된 장면만으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작가의 선명한 개성과 깊은 예술성으로, 집요하고도 의연한 작가정신을 만날 수 있던 것은 행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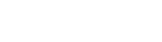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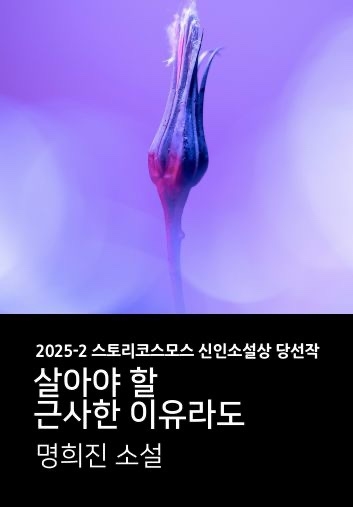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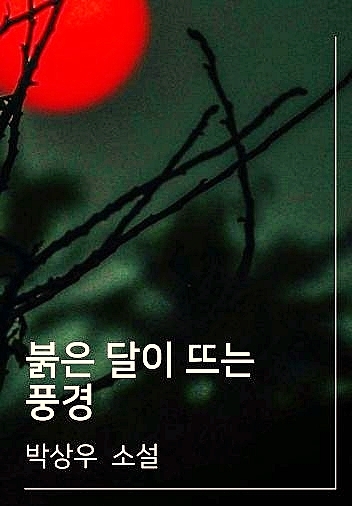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