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되도록 배제했으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실업 후 1년을 무직으로 지내다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런데 그는 딱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아내가(당연한지도 모르지만) 더 시끄럽다. 소설은 그의 재취업에 따른 아내와 주변의 반응에 집중함으로 되레 남자의 존재를 조명한다. 정체 없는 인간. 세련된 방식의 도입으로 빠지듯 독서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대단한 실의나 우울에 빠진 인간처럼 보이냐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그저 피로한 중년남자. 지나가다 한 번 볼 듯한 사람, 너무나 일상적인 한 폭의 그림 속 인물3 같아 되레 애정이 가는 인간. 헌신적이되, 그 탓에 도구처럼 사용되는 서글픈 남자.
그런 남자가 삶을 떠돌다가, 노인을 만나며 사건이 벌어진다. <캄브리아기의 달빛 아래>는 일상적인 인물과 이야기를 극히 낯설게 그려내는 소설이다. 구피와 삼엽충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작가는 소설을 위해 강으로 떠밀려 간 구피와 멸종당한 종을 불러온다. 종은 어쩌다 멸종을 맞게 되는 걸까. 기후 변화, 포식자, 지형학, 자연재해,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역사는 이 모두를 망라하여 간단히 ‘적응에 실패했다’고 정리하곤 한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어떨까. 우리도 멸종위기종과 다를 바 없이 수많은 것들에 치이며 살고 있다. 주인공 남자로 예를 들면,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 돈 문제, 남편 노릇, 사랑이 식어가는 아내, 쌓이는 시간과 죄어 오는 남의 정체성까지.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끼인 현대인은 멸종을 앞둔 동물과 다를 바 없는지도 모른다. 적응해야만 하는 시스템 속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인간은 사라질 뿐이다. 소설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극히 낯선 알레고리를 통해 그런 다시 보게 해준다.
소설 속 남자는 노인을 통해 화석이 된 캄브리아기의 돌레로바실라쿠스와 구피를 번갈아 보게 된다. 이어서 자기 자신을. 종국에는 그로테스크하면서도 환상적인 어느 합일이 이루어진다. 시간의 두께가 부드러워지며, 소설의 경계도 부드러워진다. 층위는 무너져 내리며 우아하게 융합한다. 압도적인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되고, 남자는 어느 달빛 아래 서게 된다. 진정한 탈피, 라는 말이 떠오른다. 감탄이 나오는 마무리였다.
결말이 참 재미있는 소설이라 읽은 후 후회가 남지 않는다. 아주 먼 두 요소를 중첩하는 작가의 층위가 새로웠고, 예상치 못한 결말이 압권이었다. 주인공의 심리를 따라 읽다가, 작가의 의식을 함께 사유하다가, 끝에 뒤통수를 맞는 이런 소설을 만나면, 독자로서 늘 기분 좋은 뒷맛을 챙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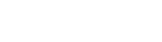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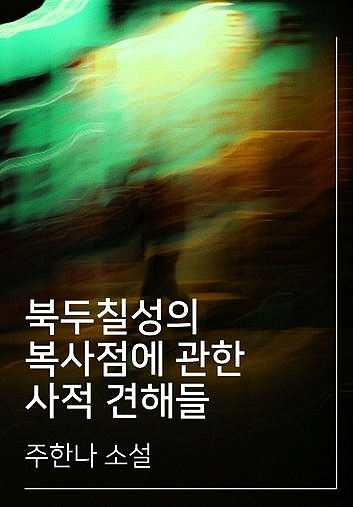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