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범죄라고 부르기도 뭣한, 거리에서 어깨를 강하게 부딪치고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는 이가 종종 있다. 그 부딪힘은 고의적 폭행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피해자들의 반응은 나뉘게 된다. 똥 밟았네, 하고 지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사과 정도는 응당 받아 마땅하다 여기고 나서는 이가 있다. 하지만 묘한 폭력의 순간이 아닌, 그 권익을 찾는 용감한 행위가 유해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 도망치는 이가 이기는 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정경은 어쩌면 현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소설 <노커> 속 작가의 상상으로 생생히 서사화되어 있다.
소설은 다정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원체 정의로운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치고 뻔뻔하게 떠나는 이에게 다가가 과실을 묻는다. 허나 그 순간, 다정은 불가해한 인지 장애 상태에 놓이게 된다. 말도 하지 못하게 된 딸 다정을 위한 엄마 민주의 조사로, 추리소설의 형식으로 소설은 진행된다.
소설의 사건은 광범위해진다. 정체불명의 범죄는 모방 범죄까지 생겨나며 사회에 창궐한다. 희생자는 늘어난다. 과실을 물을 이는 희미해져 간다. 당국의 먹이 주기 금지 권고, 내 몫을 따져 묻는 것이 문제라는 인터넷 방송인, 가짜 노커와 소송 등등. 그로테스크한 상상을 필두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된다. 독자로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여타 추리소설과 다르게 답을 갈구하지 않게 된다. 커지는 사건에 독자로서 속절없는 심정이 되고 만다. 그 심정 속에 이 소설의 핵이 담겼다.
판타지 속 희망을 찾지 못하는 와중, 흐르는 서사, 확장되는 사건과 화두는 너무도 친숙하다.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권고와 맞지만 처맞기도 하는 말을 방송인들. 회피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파생되는 2차 가해. 너무나 익숙한 일들 아닌가?
코로나가 가속 페달을 밟은 노출 미디어의 시대, ‘도망을 권고하는 사회’는 이미 창궐해 있다. 과실을 따질 수 없는 사고는 무수하고, 어그로를 끌어 돈 버는 일이 당연하며, 다정의 아버지처럼 책임 소재만 묻는 어른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이미 본질과 멀어진 지 오래고, 여러 중요한 부분은 고장 나 있다.
용기를 내는 것, 희망을 부르짖는 것이 무용한 세상. 책임 없는 악의가 마구 번지는 세상. 소설은 그 자체를 이야기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아야 옳겠다. 여기서 작가의 의식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노커 같은 불가해한 현상의 창궐보다도, ‘타인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이타적인 불안이 끼어들 틈 없는 세상’이라 느꼈다.
더는 과실을 물을 이도 없고, 여러모로 망가진 사회인 것이 사실이다. 허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다시 보고, 바로 보며,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불소통과 오해가 당연시되는 사회의 종착은 총체적 기능 마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작가의 입담에 대해 짧게 덧붙이지 않을 수 없겠다. 간결한 형식을 두고, 매력적인 문체로 이야기를 능수능란하게 펼쳐 나간다. 능청스러운 언어유희와 독보적인 필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문장이지만, 개인적으로 소설 내내 발산하는 작가의 매력을 음미하며 읽었다.
노커처럼 후드 속 보이지 않는 얼굴이 도처에 깔린 무서운 세상이다. 소설을 통해 현시대를 다시 볼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 민주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세상에 무력해지고, 끝에는 그녀와 함께 무한의 권능을 지닌 깍두기가 마법을 가져다주기를 기대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은 즐거운 독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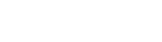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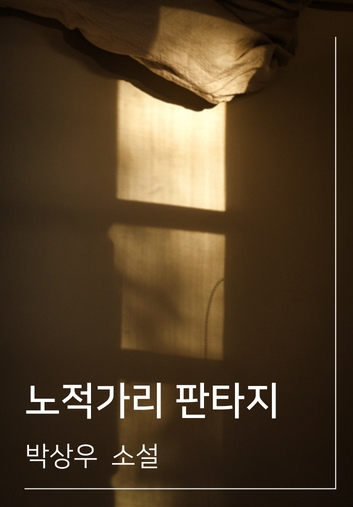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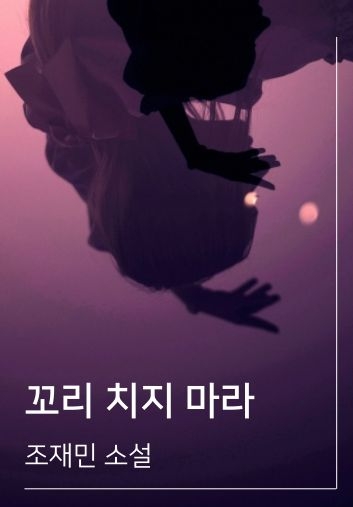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