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되도록 배제했으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설은 때때로 현실을 초과한다. 그게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 혹은 극한의 비극이어서가 아니다. 작가가 세상을 적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깊이 사색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게 서사라는 미적 가치로 환원되었을 때, 소설은 현실을 잡아먹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다.
<점심은 없습니다>는 제목부터 한국인이라면 감각이 곤두세워지지 않을 수 없다. 한 많은 민족.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니라고 인사하고, 밥이 보약이라고 말하고, 밥심을 늘 강조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제목부터 점심은 없다고? 그건 너무하잖아…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소설은 유란이라는 점심 식대를 제공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사원의 이야기이다. 그 속에는 계급과 차별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겨 있다. 이어지는 수많은 비극들. 정규직의 텃세, 무시, 견제 등. 읽은 이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든다. 재수 없는 주변 직원들에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 나도 화가 나 버리고, 유란을 응원하게 된다.
허나 그런 비극을 비극처럼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소설의 빛나는 부분이며, 이 소설이 진짜 현실보다도 현실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작가의 문장은 통통 튀면서 덤덤히 차별과 불합리함을 전하지만, 유머러스한 톤을 잃지 않는다. 이런 작가만의 톤이 여타 리얼리즘 소설의 지리멸렬함, 구구절절함과 차별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자기연민 없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런 당당함이 이 소설을 현실보다도 더 현실처럼 만들기도 한다. 비극이라고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어른이 현실 속 그리 흔한가. 슬프지만 사회에 속한 어른이라면, 유란처럼 유머러스하게 친구에게(독자에게) 풀듯 해소하는 것이 더 현생에 밀접해 있다. 그녀는 본인에게 ‘입사 축하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어른이고, 그런 어른이 비극에 어떻게 유쾌하고도 현실적으로 대처하는지가 소설 속에 있다.
유란이 종국에 더는 차별을 참지 못하는 폭발하는 장면은 독자에게 커다란 해소로 다가온다. 독자로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이었고, 시원한 욕지거리를 뱉는 유란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가 앞으로도 본인을 잘 지킬 것만 같아서. 모두들 유란처럼 정글 같은 사회 속 어른스럽게 본인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취업이든, 작은 성취든, 자기 자신을 축하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작가만의 목소리로 현실을 잡아먹는, 빼어난 성취를 이룬 소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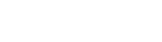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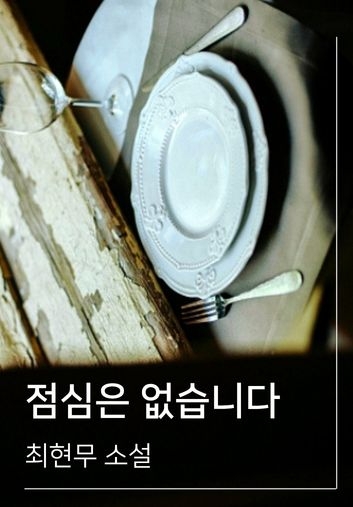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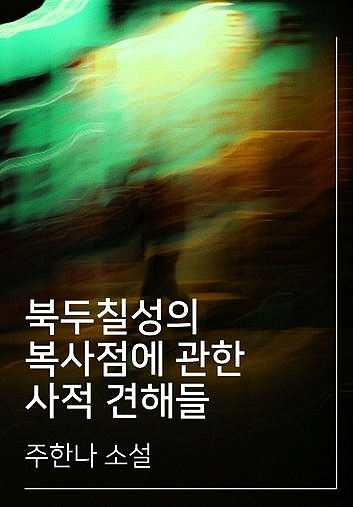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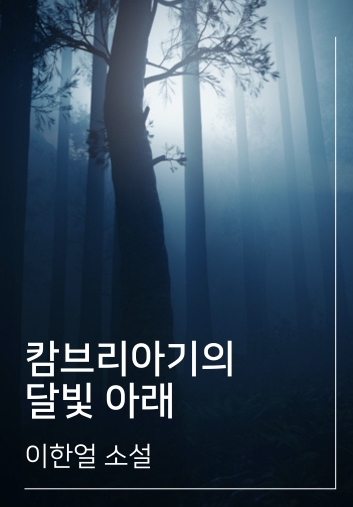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