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읽은 후 대단히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는 소설이 있다. 막대한 에너지들의 부딪힘, 악의, 슬픔, 열의, 그것에 독자로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다음날 혹 그다음 날까지 남는 충격적인 소설, <노적가리 판타지>다.
장애가 있는 성불구 동생을 둔 주인공과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동생과 결혼을 약속한 목사의 딸. 둘은 밀회를 즐기다가 동생의 자살을 마주한다. 이 소설은 설정부터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격한 감정과 부딪힘을 내포하고 있다.
흥미진진하고도 무서운 서사와 별개로, 작가의 전략은 한 단계 위에 있다. 이런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현실은 이야기이다.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소설이란 환상의 공간으로 독자를 안내하고, 그게 곧 현실이라고 직시하게 만든 뒤, 다시 환상으로 빠져나간다. 소설이기 이전에, 그게 뒤엉켜 사는 인간사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자연이라고, 구조부터 주제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 깊은 진실이 하나 숨어 있다. 배역. 삶은 그게 어떤 형태이든 다만 흘러가는 것이고, 겪는 것이다. 결론은 없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니까. 우리는 어느 삶의 시나리오 속 하나의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소설은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섬뜩한 질문이 솟아오른다.
그렇다면, 소설 속 주인공이 느끼는 애도와 슬픔마저 연기인가?
그런 인식에 다다른 순간, 소설의 에너지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이된다. 나 역시 그런가. 슬픔을 연기하고 있나. 열의를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이야기의 힘이었다.
한데 며칠이 지나고 보니, 이런 비극적 소설이 위로로 다가오는 건 왜일까. 아마 주인공이 ‘옛날에,’ ‘옛날에,’하며 이야기의 공간으로 사라지는 마무리가 이유인 듯하다.
어떤 비극도 닥칠 수 있다. 우리는 애도마저 연기해야 하는 끔찍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허나 그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 누구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정의되지 않고, 결말은 없다.
없는 결말은 반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비극이든, 행운이든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시나리오는 흘러가는 중이다. 배우가 인물로 인해 아플 이유는 없지 않은가.
‘다만 겪는 과정’이라는 미치도록 성숙하고, 성숙하기에 아프기도 한 위로는 진귀한 독서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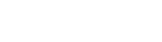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