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손바닥에 바늘로 새겨서라도 기억하고픈 것
(출처-브런치, 임재훈 NOWer)
어렸을 때 자주 체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바늘로 손가락 끝을 따 주곤 했다. 쿡, 하고 굵은 바늘이 손가락 끝을 찌르면 금세 검붉은 피가 솟아났다. 이제 곧 좋아질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당시 나는 그런 행위와 말들이 다소간의 미신처럼 여겨졌다. 곧 죽을 것처럼 배가 아팠는데 이깟 바늘이 뭐라고. 여전히 바늘이 지닌 마법 같은 신비한 효험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다. 한편으로 당시에는 막혀 있던 뭔가가 뻥~ 뚫린 것 같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심리적인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임재훈 작가의 「바날이 소설」을 읽었다. 바날이 이야기는, 근미래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육필 원고 디지털 복원 사업’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외부 서사는 그러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바늘’이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소재이다.
서사에 들어가기 전, 잠깐 바날이를 검색해 보았다. 그러다 임재훈 작가의 브런치, 임재훈 NOWer에 접속하게 되었다. 브런치 글에서 바날이에 대한 어원을 찾을 수는 없었다. 대신 다른 수확을 얻었다. 작가가 챗gpt로 직접 작업한 바날이 소설 삽화 작업(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날이 소설을 쓰게 된 직접적인 작중 의도 같은 것들을 엿 볼 수 있었다.
손바닥에 바늘로 새겨서라도 기억하고픈 것.
시대는 흐른다. 많은 것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져 간다. 저절로 잊히는 것들이 태반이다. 반면, 불순한 의도로 인해 ‘망각되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들도 있다. 바날이 이야기는, 후자를 다룬다.
불순한 의도는 강력한 마법을 지닌다. 그것은 마치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썩어빠진 음식과도 같다.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야를 가리고 무의식에 침투한다. 그로부터 기억이 지워지거나, 전혀 다른 기억으로 변질된다. 그것은, 마치 진실을 가장한 망령처럼 집단의 무의식을 떠돌아다닌다.
“학생, 배 아프지요?”
바날이 이야기에서 바늘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다. 배가 아픈 주인공에게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다. 주인공의 아픔을 할머니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할머니는 바늘을 꺼내, 주인공의 손을 따준다.
“여어기가 제주요- 올라가면 울릉도- 아이고야 잘 왔네- 백길 따라 이백 리- 오옳거니 독도라!”
쿡. 할머니의 바늘이 주인공의 손에 박힌다.
새카만 핏방울이 맺히더니 이내 검불그스름한 핏줄기가 흘러나왔다.
할머니가 주인공 손에 그려 준 노래의 지도를 따라, 주인공 손에 난 피를 따라, 어느새 서사는 흘러흘러 바날이가 살았던 과거의 시공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만일, 할머니가 그날 바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혹은 주인공이 할머니의 바늘을 거절했더라면, 바날이 소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아주 사소한 바늘 하나를 통해, 주인공의 체기는 물론, 오랜 세월 불순한 의도로 인해 꽉 막혀 있던 주인공 내면의 무의식 통로가, 뻥~ 뚫리는 것이다. 그 통로는, 주인공이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역사적 진실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아주 오래전 한 섬에 살았던 바날이를 만나게 된다.
아주 오래전 대장장이 부녀가 이 마을에 살았다.
바날이 소설 속에, 또 하나의 바날이 이야기가 생성된다. 최초의 바날이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어느덧 이야기는 흘러 흘러, 주인공이 처한 현재로 되돌아온다. 그 결말 또한 인상적이었다. 바날이 이야기는, 이제 주인공의 몫으로, 더 나아가 읽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러한 열린 결말은 많은 여운을 남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오랜 세월 막힌 체기를 뚫어주듯, 작가가 가진 바늘이 한 독자의 무의식을 관통했다. 이 소설을 통해 얻은 질문을 오래도록 곱씹어 봐야겠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임재훈 작가의 작품은 특유의 매력을 지닌다. 매번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다. 작가가 가진 어휘는 놀랍도록 풍부하다. 서사에 맞게, 주인공에 맞게, 마법의 어휘 팔레트를 가진 것만 같다. 비법이 무엇인지, 담에 작가를 만날 기회가 주어지면 꼭 물어봐야겠다.
바날이.
독자로서의 바람이 생겼다. 바날이가 오래도록 기억되었으면 한다. 고운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서, 주름진 이마와 얼굴에는 행복이 깃든 미소, 그리고 한 손에 든 작은 바늘. 정겹게 불러주는 노래와 손바닥에 그려준 섬의 지도를 따라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기억에 이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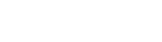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