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갈매기호텔: 2023 수상작가 자선작 김근하

 HOME
HOME2023 현진건문학상 수상작가 자선작
방파제에 앉아 있는 갈매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작은 생명은 거센 바람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서고 있을까. 갈매기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 당당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고개를 치켜들고 매혹적 뒤태를 뽐내며 앉아 있는 갈매기는 쓸데없이 힘을 주지 않습니다. 또 날아오를 때는 어떤가요. 누구보다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릅니다. 울음소리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에 적당히 필요한 힘만 담습니다. 마치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듯이.
이 소설은 그런 갈매기들의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바람과 마주 앉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힘을 아껴야 할 때는 참아내고, 써야 할 때는 정확하게 쓰는 것……
갈매기호텔에 머무는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바람과 마주하며 조금은 더 단단해지기를.
고개를 치켜들고 매혹적 뒤태를 뽐내며 앉아 있는 갈매기는 쓸데없이 힘을 주지 않습니다. 또 날아오를 때는 어떤가요. 누구보다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릅니다. 울음소리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에 적당히 필요한 힘만 담습니다. 마치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듯이.
이 소설은 그런 갈매기들의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바람과 마주 앉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힘을 아껴야 할 때는 참아내고, 써야 할 때는 정확하게 쓰는 것……
갈매기호텔에 머무는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바람과 마주하며 조금은 더 단단해지기를.
“이제 자주 못 내려오겠네요.”
풀죽은 내 목소리에 장은 자신도 이제 바닷가 사람이 다 된 것 같다며 며칠 바다를 못 보면 답답해서 수족관에 손을 담그기도 한다고 했다.
“집사람이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한다고 난리야.”
“그럼, 여기 오는 이유가 바다를 보기 위한 거네?”
그가 활어만 사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뿌루퉁하게 말했다. 보통 땐 한 달에 두세 번 내려오다가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려왔다. 언제나 내려오는 목적은 똑같았다. 싱싱한 횟감을 싸게 사는 것.
“당신은 내 마음속 아주 넓은 바다야. 난 그 바다를 보기 위해 꿈을 꿔.”
장이 내 어깨를 감쌌다. 내 얼굴이 금방 환해졌다. 밤새 까칠까칠하게 자라난 그의 수염이 내 볼에 닿았다. 따뜻한 감촉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마흔이 가까운 나이도 잊은 채 그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여려지는 기분이었다.
“집사람에게 횟집을 넘겨줄 생각이야.”
오징어를 활어 수송차량에 싣고 난 뒤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간 카페에서 그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나는 뜨거운 커피를 꿀꺽 삼켰다. 목이 따끔거렸다. 혀로 지그시 눌렀다. 경매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 일찍 문을 연 카페는 추위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은행 융자도 집사람 앞으로 받았거든. 난 아직 회 뜨는 것이 서툴러.”
그는 알맞게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를 만나면서 결혼을 꿈꾸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온전히 내 몫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포기했다. 그는 언젠가는 가족이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라는 말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내 손을 꽉 움켜잡았다.
카페를 나와 트럭에 오르던 장이 말했다. 이렇게 힘들게 만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는 여느 때보다도 말이 많았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너스레를 떠는 것처럼 보였다. 쉴새 없이 입을 벙긋거렸다. 오염된 바닷속에서 신열을 앓는 물고기 같았다.
풀죽은 내 목소리에 장은 자신도 이제 바닷가 사람이 다 된 것 같다며 며칠 바다를 못 보면 답답해서 수족관에 손을 담그기도 한다고 했다.
“집사람이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한다고 난리야.”
“그럼, 여기 오는 이유가 바다를 보기 위한 거네?”
그가 활어만 사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뿌루퉁하게 말했다. 보통 땐 한 달에 두세 번 내려오다가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려왔다. 언제나 내려오는 목적은 똑같았다. 싱싱한 횟감을 싸게 사는 것.
“당신은 내 마음속 아주 넓은 바다야. 난 그 바다를 보기 위해 꿈을 꿔.”
장이 내 어깨를 감쌌다. 내 얼굴이 금방 환해졌다. 밤새 까칠까칠하게 자라난 그의 수염이 내 볼에 닿았다. 따뜻한 감촉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마흔이 가까운 나이도 잊은 채 그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여려지는 기분이었다.
“집사람에게 횟집을 넘겨줄 생각이야.”
오징어를 활어 수송차량에 싣고 난 뒤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간 카페에서 그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나는 뜨거운 커피를 꿀꺽 삼켰다. 목이 따끔거렸다. 혀로 지그시 눌렀다. 경매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 일찍 문을 연 카페는 추위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은행 융자도 집사람 앞으로 받았거든. 난 아직 회 뜨는 것이 서툴러.”
그는 알맞게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를 만나면서 결혼을 꿈꾸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온전히 내 몫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포기했다. 그는 언젠가는 가족이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라는 말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내 손을 꽉 움켜잡았다.
카페를 나와 트럭에 오르던 장이 말했다. 이렇게 힘들게 만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는 여느 때보다도 말이 많았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너스레를 떠는 것처럼 보였다. 쉴새 없이 입을 벙긋거렸다. 오염된 바닷속에서 신열을 앓는 물고기 같았다.
2000년 신라문학상 대상 수상
2009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당선
sobigs@naver.com
갈매기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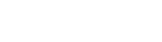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