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다이아몬드가 자라는 발가락: 2023 추천작 문서정

 HOME
HOME2023년 현진건문학상 추천작
이 소설은 ‘만약 발가락에 보석이 자란다면?’, 하는 가정 하나로 시작됐다. 그건 정말이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다. 그렇지만 팍팍한 세상에 로또 당첨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주고 싶었다.
끊임없이 걷고 달리고 노동을 해야 하는 ‘발’. 그런 ‘발’에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행운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이 소설을 끝까지 쓰게 했다.
이 작품을 쓰는 동안 나는 자주 소리 내어 울었다. 아버지의 오른발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공무 수행 중에 오른 다리와 오른발을 다쳤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통증으로 힘들어하셨다. 그런 다리를 끌고서 가장의 책무를 다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하다.
어쩌면 이 소설은 내가 쓴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나보다 더 젊은 나이에 떠나버린, 세상에 없는 아버지가 쓴 것인지도 모르겠다.
끊임없이 걷고 달리고 노동을 해야 하는 ‘발’. 그런 ‘발’에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행운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이 소설을 끝까지 쓰게 했다.
이 작품을 쓰는 동안 나는 자주 소리 내어 울었다. 아버지의 오른발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공무 수행 중에 오른 다리와 오른발을 다쳤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통증으로 힘들어하셨다. 그런 다리를 끌고서 가장의 책무를 다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하다.
어쩌면 이 소설은 내가 쓴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나보다 더 젊은 나이에 떠나버린, 세상에 없는 아버지가 쓴 것인지도 모르겠다.
세공실에서 나온 정 실장이 대뜸 내게 물었다.
“이 물건 어디서 났어요?”
“엄마 물건이에요. 좀 오래된 거예요.”
그럴듯하게 둘러대려니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나왔다.
“이건 원석이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에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GIA나 우신 제품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거예요. 크기는 0.3캐럿 정도. 여태 이렇게 품질이 좋은 물건은 처음 봐요.”
정 실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얼른 자리로 돌아왔다.
혜진은 아주 작은 소리로 물었다.
“뭐래? 보석 맞지?”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야, 하면서 혜진은 뒷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도저히 정 실장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이 물건 어디서 났어요?”
“엄마 물건이에요. 좀 오래된 거예요.”
그럴듯하게 둘러대려니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나왔다.
“이건 원석이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에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GIA나 우신 제품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거예요. 크기는 0.3캐럿 정도. 여태 이렇게 품질이 좋은 물건은 처음 봐요.”
정 실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얼른 자리로 돌아왔다.
혜진은 아주 작은 소리로 물었다.
“뭐래? 보석 맞지?”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야, 하면서 혜진은 뒷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도저히 정 실장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불교신문 신춘문예 당선
소설집 『눈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핀셋과 물고기』
백신애문학상 수상
다이아몬드가 자라는 발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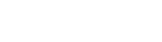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