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신춘문예 유감 김솔


 HOME
HOME회사를 떠난 직원들이 대부분 한 개 이상의 화분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밝혀졌다. 직원들은 희망이 없는 회사 생활을 견디기 위해 가장 순종적이면서도 가장 느리게 자라는 생명체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무사히 정년을 맞이하길 기대했을 것이나, 식물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다. 남은 직원들은 떠난 직원들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라도 그 화분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각자 돌봐야 할 화분을 나누고 출근하면서 하루 종일 정성스레 돌봤다. 하지만 뒤늦게 화분의 숫자를 파악한 사장은 직원들이 업무 중에 화분을 돌보느라 업무에 소홀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결정이 적절했음을 자위했다.
유리 제조공장에서 일어난 촌극 이후로 신춘문예 존폐에 관한 논쟁이 다시 번졌다. 위대한 작가는 태어났을 뿐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도 공모와 심사를 통해 작가를 발굴해 내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성실한 수험생만이 경쟁에서 이길 것이고, 합격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선생과 학교, 학원이 모여들면서 문학은 더욱 퇴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짜 천재들의 득세가 독자를 멸종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반박하는 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독자가 먼저 떠났고 그들의 일부가 돌아와 작가가 됐으며 작가와 독자는 책 이외의 매개체로 더욱 자주 만나 서로의 자리를 바꾸고 있으므로 작가 면허증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춘문예가 당선자의 권위와 생계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술적 소명을 지닌 딜레탕트의 등장이 활발해졌으니, 신춘문예의 긍정적 부작용을 상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논쟁은 항상 독자는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느냐는 질문으로 끝이 났다. 뛰어난 독자가 있는 곳에서 위대한 작가가 태어나는 만큼 독자는 유행과 가독성을 따지지 않고 과감한 모험과 지루한 순례를 병행해야 한다고 어떤 평론가는 주문했다. 어떤 독자는 혀를 차면서, 모국어로 쓴 소설에는 많지만 외국어로 쓴 소설에는 없는 것들 때문에 국내 독자가 사라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게 무엇이냐고 A가 물었더니 AI는 ‘아버지, 또는 꼰대’라고 대답했다.
이를 반박하는 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독자가 먼저 떠났고 그들의 일부가 돌아와 작가가 됐으며 작가와 독자는 책 이외의 매개체로 더욱 자주 만나 서로의 자리를 바꾸고 있으므로 작가 면허증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춘문예가 당선자의 권위와 생계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술적 소명을 지닌 딜레탕트의 등장이 활발해졌으니, 신춘문예의 긍정적 부작용을 상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논쟁은 항상 독자는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느냐는 질문으로 끝이 났다. 뛰어난 독자가 있는 곳에서 위대한 작가가 태어나는 만큼 독자는 유행과 가독성을 따지지 않고 과감한 모험과 지루한 순례를 병행해야 한다고 어떤 평론가는 주문했다. 어떤 독자는 혀를 차면서, 모국어로 쓴 소설에는 많지만 외국어로 쓴 소설에는 없는 것들 때문에 국내 독자가 사라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게 무엇이냐고 A가 물었더니 AI는 ‘아버지, 또는 꼰대’라고 대답했다.
201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
소설집: 『암스테르담 가라지세일 두번째』 『살아남은 자들이 경험하는 방식』 『망상, 어語』 『유럽식 독서법』 『말하지 않는 책』,
장편소설: 『너도밤나무 바이러스』 『보편적 정신』 『마카로니 프로젝트』 『모든 곳에 존재하는 로마니의 황제 퀴에크』 『부다페스트 이야기』 『사랑의 위대한 승리일 뿐』 『행간을 걷다』
문지문학상, 김준성문학상, 젊은작가상 수상
nyxos@hanmail.net
신춘문예 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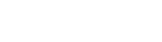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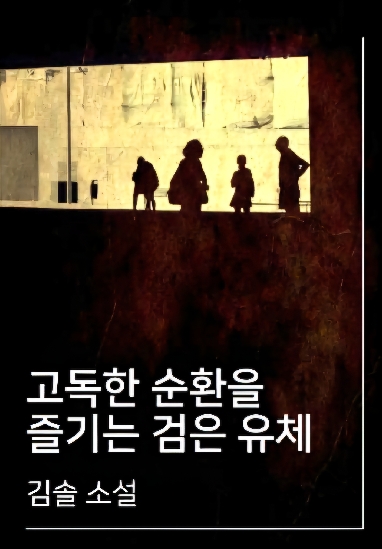

총 개